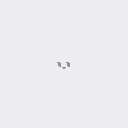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아나패향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84.*.*)
작성자:
아나패향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84.*.*)
일반 프로듀서
댓글: 11 / 조회: 845 / 추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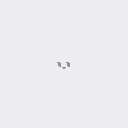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아나패향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84.*.*)
작성자:
아나패향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84.*.*)
일반 프로듀서
관련 링크가 없습니다.
제 글들중 옛날글들은 뭔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없는 부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이상한대서 구구절절 늘어놓거나, 이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휙휙 넘겨버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나 기억난게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배울때 뭐 소설의 뭐시기 단계라던가 갈등의 해결이라던가 카타르시스가 중요하다 그런거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런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제가 배운 것들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서술 방법의 차이 입니다.
'장면'과 '설명'.
더운 여름에 땀을 잔뜩 흘린 히비키가 물을 마시는 것으로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의 날씨가 그녀를 괴롭힐때마다, 가끔은 이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지 않게 해보기도 한다. 단순히 세일즈 포인트로써가 아니고 가나하 히비키라는 '여자'를 '사회학적'으로 구분짓기 위함도 아닌, 그 자신의 긍지이며 자존심이다. 모든 것은 감수한다. 그녀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닌 물리적 무게로써 그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매체 이다.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흘러내린 땀을 닦아내고는 물을 마신다.
라고 쓸수 있고
"더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에 슬쩍 웃음지어보고자 한다. 혼잣말을 잘 하지 않는 그녀가 무의식중에 일궈낸 작은 착란증세라는 조금은 짖궂은 농담을 자신에게 던져보아도 더위를 이겨낼 웃음 보다도 '나 진짜 정신착란 일으키는거 아냐?' 라는 진중한 자아성찰이 되어버린다. 벌써 많은 땀을 흘렸다. 계속해서 땀을 닦아내던 손수건은 이젠 바지의 주머니, 그녀의 하얀 속옷까지도 축축하게 적셔가며 인내심을 시험한다. 겨드랑이에 바른 건조제는 이미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지 오래다. 그녀가 몹시도 피하고 싶던 옷의 겨드랑이부분이 땀으로 적셔지는 것 까지 더이상 신경쓸수 있을 수준의 더위가 아니다. '차라리 민소매를 입을걸' 이라는 비명아닌 비명을 살짝 마음속에 질러본다. 자신의 머리가 분명 이 남들보다 많은 땀을 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신이 이것을 기르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해 왔는가. 그것을 농담으로 '더 더우면 확 잘라버린다' 하며 위협을 해보기도 하지만 더이상 웃음이 나지도 않는다. 티의 아랫부분을 잡고 펄럭이며 공기를 순환시킨다. 이 작은 이동이 그녀의 배와 가슴에 맺혀있떤 있던 땀들을 날려버리며 조금은 시원해진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미 몸 밖으로 배출된 수분은 어디선가 다시 보충해야 할터. 그녀는 그렇게 땀을 말리면서 냉장고 앞에 선다. 왼손으로는 셔츠의 목 부분을 잡고 펄럭이면서, 오른손으로 냉장고의 문을 연다. 차가운 냉기를 즐기고 싶었음에도 오히려 땀으로 젖은 옷을 차갑게 만들어 기분만 나빠질 뿐 그 시원함이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문에 꼽혀있던 생수 한병을 꺼내들고 문을 닫는다. '아무런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뚜껑을 열고 단숨에 물을 들이킨다.
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두 묘사 방법의 차이는 히비키가 물을 마시는 행동을 어떻게 써내느냐 입니다.
위의 것은 '설명'이고 아래의 것은 '장면' 입니다(만 한글 역칭은 제가 적당히 생각해낸것으로, 'Description'과 'Scene'입니다).
설명은 인물의 행동을 설명 함으로써 극을 진행 시킴니다.
그 설명은 단순히 '히비키가 더워서 물을 마셨다'가 될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조금 추상적인 '설명'을 덛붙였습니다.
아래는 장면으로써 인물이 행동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극을 진행 시킴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활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장면을 구축해나가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히비키가 물을 마신다' 이지만, 그 서술 방법의 차이는 단순히 분량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자가 느끼는 시간진행의 차이 입니다.
단순히 분량의 차이가 아님니다.
설명을 볼때 독자는 이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 씬이 아닌 정지된 씬으로써 인식합니다.
이 설명이 끝날때 까지 작가는 이 부분을 정지된 시간으로써 활용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자인 글과 영상매체의 가장 큰 차이이고, 대본과 소설의 차이 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어느 순간인가 단 한순간이라도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와버리면 그 생명력은 끝나버리고, 계속해서 설명과 장면이 짧은 부분동안 반복될경우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극의 이해를 저해시킨다...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제 글 초창기에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잘못쓰고 있는게 노골적으로 눈에보여서 기억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셔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손발이 오그리토그리 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총 38,186건의 게시물이 등록 됨.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 같은 느낌?
저는 쇼잉과 텔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없으니 아마도...
과연 비슷한 개념이었군요!
번역된 책같은걸 읽어보면, 특히 양서를 번역한 책들은 역자의 취향 따라서 번역되고 의역되면서 많이 죽어서 느끼기가 힘들죠.
제가 글의 스타일에 대해 확실히 느끼게된건 시바 료타로의 소설을 읽고 '뭔놈의 소설을 이렇게 쓴다냐' 하고 생각했을때 였습니다.
설명에서는 시간이 멈춘다고 인식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거고, 그 설명의 내용에 따라서 시간을 빠르게 전개할수도 있습니다.
가령 '가나하 히비키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마시고 에어컨을 틀엇음에도 여전히 부족하여 찬물로 샤워를 하고난뒤, 속옷만 걸친체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감기약을 먹으며 두꺼운 옷을 껴입고 누워있는 이유 이다.'
라는 식으로 쓰게된다면, 독자입장에서의 현재 시간은 '감기로 쓰러진 히비키'가 됨니다. 비록 첫번째 문장의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즉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탬포를 조절할수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었지?' 하면서 글을 의식해서 쓰는것이 아닌, 글을 쓸때 '이 부분에는 이걸 쓰자.' 하면서 활용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쉽게 쓰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