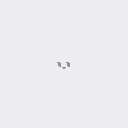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HIDEBU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53.*.*)
작성자:
HIDEBU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53.*.*)
일반 프로듀서
댓글: 9 / 조회: 1479 / 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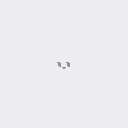 작성자:
HIDEBU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53.*.*)
작성자:
HIDEBU
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53.*.*)
일반 프로듀서
관련 링크가 없습니다.
봄이 왔다. 바람 부는 숲에서는 여린 잎사귀들이 스치는 소리가 비처럼 쏟아진다. 부드럽게 녹은 땅을 뚫은 푸른 줄기는 촉촉한 뿌리를 뻗으며 굵어지고 질겨질 준비를 한다. 초원 위에 선 시죠 타카네는 위로는 선홍색 벚꽃을 흐뭇하게 올려보고 아래로는 땅에 핀 작고 예쁜 색색의 꽃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봄이 오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가 어디까지나 봄의 풍경에 어울리지 못하는 방관자이자 이방인임을 잊지 않는다. 시죠 타카네는 봄을 알지 못한다. 혹독한 추위와 메마름이야말로 그녀의 계절이다.
보이지 않는 세찬 눈보라가 그녀의 마음을 시리도록 얼린다. 굽이치는 머리카락도 새하얗게 얼어붙고 만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녀의 가슴속에 몇 구절의 시가 스친다. 감긴 눈꺼풀 안의 풍경에서는 덧없는 눈꽃이 희미한 온기가 남은 뺨에 내려앉으며 한순간에 녹아내린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늙은 벚나무 몸통을 어루만진다. 까끌까끌한 껍질이 그녀의 여린 손에 자국을 남긴다. 시상이라도 떠오르는 듯 그 자국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손을 털고 발길을 돌린다. 작은 새가 지저귀고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등진 채 그녀는 홀로 조용히 걸어간다.
모든 것이 잠들어버리는 밤은 쓸쓸한 시간이다. 갈 곳 없는 그녀에게는 그 외로운 밤이 찾아오는 것이 빠르다. 달에서 쏟아지는 여린 듯 매서운 빛은 태양보다도 맹렬하게 세상을 비춘다. 고요한 강가에 홀로 선 그녀의 등 뒤에는 밤하늘보다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녀는 말없는 별과 구름을 올려다본다. 온갖 것을 삼키는 보름달이 일렁일 때도, 심연에 삼켜진 그믐달이 어둠을 흘릴 때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계시를 기다리는 신관처럼, 고향을 그리는 유배자처럼 하염없이 고개를 높게 들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머나먼 별을 올려다본다. 그녀는 고요한 가운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그때 한순간, 쨍 하는 빛 한 줄기가 달에서 떨어져 내리며 짙은 어둠 속을 예리하게 투과한다. 그녀의 눈에 어렸던 원망과 체념이 눈물 한 방울이 되어 뚝 떨어진다. 소리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쌀쌀한 바람에도 말라붙질 않는다. 그녀의 모습은 봄의 녹음을 즐기던 때와 사뭇 다르다. 부자연스럽던 여유로움은 이제 사무치는 비감이 되어 그녀를 밤의 경치에 녹아내리게 한다. 아무도 없는 밤에 그녀만의 시간이 흐른다. 그녀의 슬픔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의 감정이며 누구도 볼 수 없는 신비의 감정이다. 그녀는 그 감정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다시 한 번 꼭꼭 숨긴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외롭기만 하다. 그녀는 나약하게 밤하늘만 올려보며 훌쩍이는 스스로와 작별을 고하고 싶어 한다. 마음속의 추위를 걷고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울 봄을 느끼고 싶다. 나른한 봄바람에 몸을 싣고 상념과 신념을 모두 내려놓고 한없이 먼 곳으로 흘러만 가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 그녀는 또다시 한숨만 흘린다.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 역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섭리다. 혹독한 겨울도 견뎌낸다면 봄이 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그녀의 겨울은 끝나지 않는다. 시간과는 상관없는 계절이 그녀의 마음을 감싼다. 그 역시 그녀에게 있어 하나의 섭리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사명 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는 없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다. 여린 스스로에게 모질어질 것을 눈물을 훔치며 부탁한다.
그녀는 겨울의 사람이다. 겨울에 태어나 겨울을 살아가는 그녀는 언제까지나 차가운 우주를 외롭게 떠도는 작은 별이다. 하늘에 흐르는 별이 목적지를 밝히지 않듯 그녀 역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유성의 꼬리처럼 흩날리는 머리칼은 그녀의 쓸쓸한 모습을 남다르게 만든다. 언뜻 스치는 찰나의 미소는 빛을 흘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 그녀의 아픔은 아름다움으로 흘러넘쳐 그녀를 시죠 타카네답게 만들었다. 아픔이야말로 타카네를 완성시켰다. 타카네는 뼈를 깎는 그 차가움을 끌어안는다. 아프게나마 그것이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타카네는 마음속으로 작은 말을 곱씹는다.
봄이여 오라. 이 차고 슬픈 가슴에 추운 봄이여 오라.
그리곤 타카네는 조용히 웃는다. 슬프기만 했던 타카네의 눈빛은 이제 감정을 짐작할 수도 없을만큼 깊다.
총 1,260건의 게시물이 등록 됨.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녀의 마음에 봄이 오게 만들어 주겠군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뭔가 타카네라면 진짜로 이렇더라도 이상할게 없내요.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좀 계절감 넣어 쓰니 신박하네요
타카네도 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